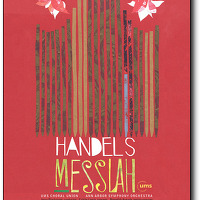수년 전 마사키 스즈키(Masaaki Suzuki)가 이끄는 바흐 콜레기움 재팬(Bach Collegium Japan)이라는 단체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단체의 이름이 귀에 그대로 와서 박혔던 기억이 있다. 아마도 바흐와 재팬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고 마치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듯한 바흐의 음악과 무엇을 만들어도 꼼꼼하게 만드는 장인 정신으로 유명한 일본의 이미지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흐의 종교 음악과 일본이라는 이미지의 어딘가 모를 불협화음과도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특별한 첫인상으로 다가왔던 마사키 스즈키와 바흐 콜레기움 재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아시아 지역 연주 단체로서 바흐의 음악을 제대로 연주하는 전문 공연단체로 자리매김을 해 왔고, 그만큼 나의 관심도 더해졌다.
그러던 차에 접하게 된 바흐 콜레기움 재팬의 바흐 B 단조 미사 공연 소식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공연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바흐의 음악 중에서 아직까지 실연으로는 들어보지 못했기에, 실연으로 가장 듣고 싶은 곳으로 꼽는 것이 바로 ‘마태 수난곡’과 ‘B단조 미사’인데, 이 중에 한 곡을 연주한다니 나로서는 바흐 콜레기움 재팬의 명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가장 듣고 싶은 바흐의 곡 중 하나를 들을 수 있는 찬스 중에 찬스였다. 이틀 연속으로 두 곡을 모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쉬울 따름이었다.
당일 공연의 시작은 특별히 일본 연주 단체의 공연인지라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애도하는 1분간의 침묵의 시간을 가졌는데, 3천여명에 달하는 청중들의 침묵은 어느 공연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고요함을 가져왔는데, 십 수초가 지나 몇 명이 작은 기침을 하기 전 까지는 옷 스치는 소리마저 나지 않아 마치 큰 공연장에 나 혼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적막했다. 눈을 감고 지진 피해를 애도하는 한 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이 정도로 조용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놀랐다.
연주회 날짜를 기다리며 귀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 고른 음반은 최고의 명반중의 하나로 꼽히는 칼 리히터 지휘의 연주 음반이었는데 한가지 실수라면 실수라 할 수 있는 것은 리히터 음반의 연주와 마사키 스즈키 지휘의 연주와는 그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는 점이다. 리히터 음반의 경우 현대 악기를 사용하고 편성도 늘려 음량 그 자체로 일단 압도할 정도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면 바흐 콜레기움 재팬의 경우 원전악기를 사용하고 편성도 원래의 소편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음량을 들려준다는 점이었다. 이런 이유로 첫 곡 ‘Kyrie’의 경우 리히터 음반과 같은 웅장한 음량을 자연스레 기대하고 있던 귀를 원전연주 레벨로 조정하는 데 3~4분 정도 적응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원전연주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전 첫 몇 분은 다소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으나 그 첫 몇 분이 지난 후로는 자연스레 음악에 몰입되어 갔다. 악기간에, 또는 악기와 합창단간의 어색하게 느껴지던 밸런스는 점차 사라져가더니, 어느 새인가 다른 연주와 비교하면 작디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음량에도 몸이 떨리는 듯한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다. 큰 음량의 소리에만 익숙해져 있던 내게 원전연주는 다소 새롭긴 하지만 계속 듣기에는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전연주를 통해서도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음량 밸런스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긴장과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공연장에서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오늘자 앤아버 지역 신문에 올라 있는 이번 공연의 리뷰 또한 완벽에 가까운 놀라운 연주라 평가하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 동의가 가는 리뷰였는데, 한가지 동의가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카운터 테너 역할을 맡은 독창자에 대한 호평이 실린 리뷰와 달리,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연에서 카운터 테너 역할을 맡은 독창자의 음색은 맑고 청명한 느낌이 부족하여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몇 가지 기대가 겹쳐있던 공연이기에, 반대 급부로 오히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공연을 본다는 자체로 의미를 두고 있는 공연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놀라운 수준의 공연을 볼 수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공연 중 하나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바흐 콜레기움 재팬, 추후에 한국에 내한하여 공연을 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티켓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 같다.
덧붙임.
옆자리에 계셨던 한 분과 인터미션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서양 분이라 나이 가늠이 어려웠는데, 아마도 70대 정도 되신 것 같다. 캐나다 출신이시고 간호사셨는데, 의사인 남편을 만나 미국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명도 어둡고 나이 가늠이 잘 되지 않아 ‘남편 분은 아직 일하시느냐’고 물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식들도 근처에 같이 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 분이긴 했으나, 부부 중 한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낸 자의 쓸쓸함이 왠지 느껴졌다. 청중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인 분들이었던 공연. 인터미션 시간에 다들 두서너 명씩 둘러 모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분은 내 옆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안이나 주위를 천천히 살피며 혼자 서 계시다가 잠시 나갔다 들어오셨다. 그 분이 정말 그 당시 쓸쓸함을 느꼈는지,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나에게는 늙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Archive (~2013)'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기 필하모닉 말러 3번 - 2012.03.17 (0) | 2012.03.19 |
|---|---|
|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 2012.02.18 (0) | 2012.02.20 |
| 핸델의 '메시아' - 2010.12.05 (0) | 2010.12.07 |
| Mariinsky Orchestra (Rachmaninoff, Mahler) - 2010.10.10 (0) | 2010.10.15 |
| 서울시향 말러 2번 '부활' - 2010.08.26 (0) | 2010.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