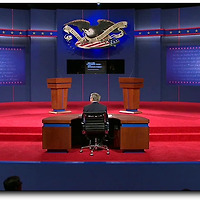로린 마젤의 오늘 공연을 보러 간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번 기회에 로린 마젤의 지휘를 보지 못한다면 언제 다시 볼 기회가 있을까’였다. 한국에 자주 내한하는 지휘자도 아닌데, 이미 여든이 넘은 나이의 거장의 지휘를 이번에 보지 못하면 다시는 볼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다소 서글프게 느껴지는 이유 때문이었다. 18년 만에 내한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도, 말러 교향곡을 연주한다는 것도 거장의 나이에서 비롯된 이유에 비하면 부차적인 이유였다. 연로한 지휘자이기에 힘이 부쳐 다소 연주가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오래 전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거장의 손길을 통해 들려오는 말러 교향곡이라면 그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다 생각했다.
첫 곡으로 연주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은, 그래서 나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지휘자 로린 마젤이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쟁쟁하고, 여전히 카리스마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연주였다. 연주되는 한 음 한 음을 놓치지 않고 이끌어가는 마젤의 꼼꼼함과, 협연자를 배려하면서도 음악을 이끌어가는 그의 지도력을 느낄 수 있던 연주였다. 협연자로 나온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의 연주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녀의 연주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진대, 내가 잘 모르는 모차르트의 곡이었기도 해서 연주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휘자 로린 마젤이 내 눈앞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듯 계속 해서 그의 지휘를 보며 그가 바로 이곳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몇 번이고 상기시키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
1부 협연의 경우 소규모 편성으로 연주가 끝났고, 인터미션 후 비로소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단원이 무대를 꽉 채우고 난 후, 말러의 교향곡 1번의 연주가 시작됐다. 이제는 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공연도 적지 않게 들어봤기에 세계적 오케스트라의 연주라 해서 그 사실만 가지고 감격하던 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며 줄곧 그들이 내는 사운드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운드는 필시 지휘자 로린 마젤의 지도력 이전에 오케스트라 자체가 갖고 있는 내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텐데, 정말 심상치 않았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정확한 표현 방법을 찾긴 어려운데, 그냥 촌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모든 악기가 새로 산 신품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기 하나 하나의 소리가 살아 있었다. (어느 정도 악기가 길들여지는 시간이 흘러야 최상의 소리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다. 더 적합한 표현을 못 찾겠다.) 대장간에서 바로 나와 날카롭게 날이 벼려진, 조금의 뭉뚝함도 없고, 조금의 녹도 슬지 않아 그 자체로 서늘함이 느껴질 정도로 날이 선 검처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관의 소리는 풍부한 저음과 함께 마치 고음 부분은 이퀄라이저로 증폭해 놓은 것처럼 서늘하고 투명한 소리도 함께 들려주었다.
말러 교향곡은 관과 현이 각자의 최대 음량을 뱉어 놓아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사운드를 들려주는 부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경우 악기의 음들 하나 하나의 소리가 구분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오늘의 필하모니아 연주는 그런 최대 음량 속에서도 각 악기의 소리가 명쾌하게 구분되는 듯한, 전혀 뭉쳐지지 않은 소리를 들려주어 몇 번이나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들었다. 내가 앉았던 합창석 왼편 끝자리가 합창석임에도 소리가 좋기로 알려진 곳이라 여러 번 앉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토록 전혀 뭉게지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 것은 처음이었다. 또한 여러 악기가 서로 엇박으로 멜로디를 주고 받는 부분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음반에서도 박자가 약간 흐트러지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의 연주에서는 그런 복잡한 멜로디를 주고 받는 부분에서도 박자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4악장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지휘자 로린 마젤이 두 팔을 활짝 앞으로 펴고, 입을 활짝 벌리고 한 껏 음악에 몰입된 표정으로 오케스트라를 압도하며 이끌어 가는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다. 몇십년이 지나도 로린 마젤이라는 거장을 생각하면 이 장면이 자연스레 떠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짧은 순간의 지휘자의 모습은 내 뇌리 속에 깊게 각인되어 버렸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고 앵콜로 연주된 바그너의 뉘른베르그의 마이스터징어 서곡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선물이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앵콜곡을 지휘하면서도 온 몸을 앞으로 구부려 떠는 듯한 그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제 있었던 마젤의 말러 5번 공연평들을 읽어 보니 전체적으로 템포가 느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러 1번의 경우에도 내가 들었던 연주중에는 가장 느린 템포였던 것 같다. 말러 5번도 일반적인 연주보다 10분 이상 길었다고 하던데, 시간은 정확히 재 보지는 않았지만 말러 1번의 경우도 평균적인 연주에 비해 10분 이상 긴 연주였던 것 같다. 몇 몇 부분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느리게 연주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또 이렇게 느리게 연주하니 색다른 맛이 있구나'하고 느꼈던 부분이 여러번 있었다. 첼리비다케의 느린 템포의 연주를 무척 좋아하는 나로서는 오늘 연주를 들으며 말러 교향곡도 누군가 극단적으로 느리게 연주하는 음반이 있다면 꼭 한 번 전곡으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 연주회에서 들은 로린 마젤의 말러 1번. 말러 1번은 그래도 꽤 많이 공연에서 연주되는 곡이고, 나 또한 연주회에서 적지 않게 들었지만, 오늘 로린 마젤의 말러 1번은 그 동안 내가 들었던 말러 1번 공연 중에서 가장 최고로 완벽하고 감동적인 연주였다. 평생 잊지 못할 연주라는 말은 연주회에 종종 가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미덥지 못한 즉흥적인 표현일 터인데, 그럼에도 나는 오늘 거장 로린 마젤의 말러 1번 연주회를 평생 잊지 못할 연주회라고 말하고 싶다. 혹시 다시 한 번 로린 마젤, 그의 연주회를 볼 기회가 주어진다면(여전히 오늘의 연주회가 로린 마젤의 지휘를 보게 되는 마지막 연주회가 될 것 같다는 서글픈 생각이 든다.) 만사 제쳐두고 그의 지휘를 보기 위해 달려갈 것이다.
'Archive (~2013)'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바마 vs. 롬니 첫번째 대선 토론회 - 2012.10.03 (0) | 2012.10.07 |
|---|---|
| 수원시향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 2012.04.14 (2) | 2012.04.16 |
| 경기 필하모닉 말러 3번 - 2012.03.17 (0) | 2012.03.19 |
|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 2012.02.18 (0) | 2012.02.20 |
| 바흐 B 단조 미사 by 바흐 콜레기움 재팬 - 2011.03.24 (0) | 2011.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