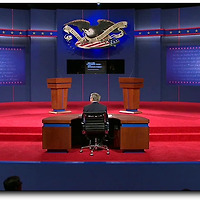조금이라도 사람들 눈에 더 띄게 하기 위해 온갖 과장과 자극적인 수식어가 난무하는 세상이다. 100년만의 기록적 더위였다느니, 기상 관측 이래 시간당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폭우였다느니 하는 날씨 보도에서부터 3대에 걸쳐 내려온 전통의 원조 설렁탕 집이라는 식의 광고도 쉽게 눈에 띈다. 100년도 모자라 심지어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사라는 식의, 어떻게든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려는 문구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그래서 과장과 자극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인가. ‘36년만의 내한 공연’이라는 문구를 타이틀로 내세운 하이팅크의 공연 소식은 충분히 그 정도의 강조를 할 만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촌스러운 표현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공연인데 굳이 저렇게 36년만의 내한을 앞으로 내세워야 했는가 하는 생각도 약간 있었다.
아무튼 36년만의 내한 공연이라니, 아무리 소싯적부터 내가 연주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 인생에 처음으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연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85살이라는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가 지휘하는 연주를 앞으로 다시 볼 기회가 없을 확률도 높다. 결국 그의 이번 내한 공연은 내 인생 마지막으로 하이팅크 지휘의 연주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었다. 거기에 더해 연주되는 곡이 브루크너 9번이라니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없었다. 늦게 소식을 접하긴 했지만 그의 공연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티켓을 예매하고 한참 동안 그의 연주회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이런 연주회 참 찾기 힘들다. 아무리 거장 지휘자가 내한한 공연이라고는 하지만 듣는 이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게 마련이다. 특히 이번 연주처럼 이틀간에 걸쳐 공연이 있는 경우 꼭 둘 중 어느 한쪽 연주는 비교적 아쉬웠던 공연이었다는 평이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는 참 감명 깊다 말한 연주를 누구는 생각보다 별로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하이팅크의 이틀간의 공연이 끝난 어제 밤 이후 오늘까지 다양한 곳에서 그의 연주에 대한 평을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모두 호평 일색인 평가는 정말 처음 본 것 같다. 이틀 공연 모두 만족스럽고 감동스러운 연주였다는 평가밖에 찾아 볼 수 없었고, 그 글에 달린 여러 댓글도 하나같이 공연의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외는 있는 법. 보기 드물게 연주회장을 찾은 거의 모든 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하이팅크의 연주회를 별로 감명 깊게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성격이 까칠해서, 귀가 예민해서, 비판의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서, 아니면 남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을 유일하게 혼자 발견할 수 있는 무슨 엄청난 내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어제의 브루크너 9번 연주에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한 것은 하이팅크의 책임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책임도 아니다. 아쉽게도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번주, 다음주가 원래 일이 좀 몰려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예정에 없던 출장 일정까지 잡히면서 일이 더 바빠져 버렸다. 공연 전날 밤 새벽 4시 경에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든 건 대략 새벽 5시 정도였던 것 같다. 몇 시간이라도 잠을 푹 잤으면 좋았으련만 설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떴다. 아직 마치지 못한 일이 있고 오후에 공연을 다녀올 것까지 감안하면 빨리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3.1절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정신 없이 일을 했다. 그렇게 일 하다가 공연 1시간 앞두고 그제서야 부랴 부랴 씻고 집을 나서 공연장으로 향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연주 시작하기 전 자리에 앉아 목을 좌우로 수도 없이 꺾고, 어깨를 주무르며 어떻게든 두통이 사라지길 바랬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첫 곡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듣다 보니 잠이 오기까지 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잠시 눈이라도 감고 있으면 두통이라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잔잔한 음악 소리에 맞추어 눈을 감고 차분한 호흡으로 심신을 안정시켰다. 좀 괜찮아 지는가 싶었는데, 눈을 뜨고 나면 두통은 다시 시작되곤 했다.
브루크너 9번이 시작됐다. 음악은 흐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으로 음악이 점차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이미 감동 받을 준비를 하고 그 클라이막스의 순간을 긴장되게 기다리다가 절정의 순간에 감격의 기분을 느꼈을 텐데, 머리가 아프니 클라이막스고 뭐고 다 귀찮아졌고, 머리는 몽롱한 상태가 지속됐다. 몇 번이나 ‘아 이 부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지속적으로 지나가고 있었지만 당시 내 상태는 귀로 들어오는 음악은 그냥 소리일 뿐 귀로 들리는 음악을 즐기고, 감동할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아무튼 그렇게 연주는 끝났고, 공연 2시간 사이에 이번 출장 업무와 관련되어 메일이 10여통이 넘게 온 것을 확인했다. 비교적 시급했던 사안이라 내가 답을 해야 하는 것들을 걸어가며 핸드폰으로 일일이 답장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하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바람까지 부니 그제서야 좀 정신이 드는 듯 싶었다. 그렇게 찬바람을 받으며 길을 걸으니 정신도 다시 좀 맑아지는데, 불과 몇 분 전 공연이 마치 설잠을 자면서 어렴풋하게 꾼 꿈처럼 금새 기억 속 저편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고, 다시 집에 도착하니 내가 공연을 보고 온건 맞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무튼 남은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다시 일을 하다가 다시 새벽에야 잠이 들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오후 이곳 저곳을 서핑하며 어제 하이팅크 공연 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모두가 감동적이라 말하는 공연도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공연에서 나는 아무 감동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다시금 아쉬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뭐 이럴 때도 있는거지 하며, 얼마 후에 예정된 괜찮은 공연 미리 예매하는 것으로 아쉬운 마음을 그나마 달래긴 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36년만에 내한하신 하이팅크 옹, 내년에 다시 한번 내한하면 안되시나요?
'Archive (~2013)'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르디 '팔스타프', 국립오페라단 - 2013.03.23 (0) | 2013.03.24 |
|---|---|
| 경기필 드뷔시 <바다>,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 13.03.16 (0) | 2013.03.17 |
| 첫 토론회에서 오바마가 질 수 밖에 없는 이유 (2) | 2012.10.07 |
| 오바마 vs. 롬니 첫번째 대선 토론회 - 2012.10.03 (0) | 2012.10.07 |
| 수원시향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 2012.04.14 (2) | 2012.04.16 |